‘3D, 삼디, 쓰리디’
“외국에 나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말 버리기’를 자랑처럼 여기는 것도 터무니없다. 대통령이 영어에 능통하면 외교도 잘 하리라 여기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통역자나 대사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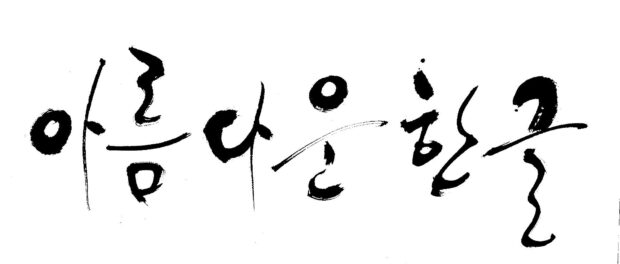 사상사(思想史)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자학(朱子學)이라 부르는 성리학(性理學)을 생각해봐야 한다. 성리학은 중화사상(中華思想, Sinocentrism)이고 (화이분별(華夷分別) 또는 화이분별론(華夷分別論)에 따라 우리를 오랑캐로 본다. 오랑캐를 면하려면 중국 문화를 모방해야 한다. 즉, 모화(慕華)가 문화의 이념이었다. 글자에서도 중국을 따라야 한다. 독자적인 문자는 오랑캐의 상징이다. (우리말을 차별하고 천대하는 구조화를 낳게 한 것이다.) 이는 한글 반대파인 최만리 등이 상소문에서 ‘중국과 같은 글자를 써야 한다’는 뜻으로 쓴 ‘동문(同文)’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일본, 여진, 서하(西夏), 토번(吐蕃) 등은 고유 문자를 사용했는데 최만리는 이를 두고 문화 민족인 우리는 이들과 같을 수 없다고 했다. 한글 반대파 입장에서는 한자를 쓰지 않으니 모두 오랑캐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오랑캐 문자(언어)를 만들어 쓰려 하느냐는 게 이들의 논리다. 그러면서 여자, 어린 아이가 보는 게 언문(言文)이라고 폄하했다. 반면 한문은 성현의 권위 있는 문자(언어)로 인식했다. 중세 유럽의 공동 언어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듯이 한문은 공통어이고 신성한 문자라고 생각했다. 한문이 언어의 뿌리이고 독점적인 언어라고 인식했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했지만 공문서에 한글은 쓰지 않고 오로지 한자만 사용했다. 한글을 외면했다.
사상사(思想史)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자학(朱子學)이라 부르는 성리학(性理學)을 생각해봐야 한다. 성리학은 중화사상(中華思想, Sinocentrism)이고 (화이분별(華夷分別) 또는 화이분별론(華夷分別論)에 따라 우리를 오랑캐로 본다. 오랑캐를 면하려면 중국 문화를 모방해야 한다. 즉, 모화(慕華)가 문화의 이념이었다. 글자에서도 중국을 따라야 한다. 독자적인 문자는 오랑캐의 상징이다. (우리말을 차별하고 천대하는 구조화를 낳게 한 것이다.) 이는 한글 반대파인 최만리 등이 상소문에서 ‘중국과 같은 글자를 써야 한다’는 뜻으로 쓴 ‘동문(同文)’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일본, 여진, 서하(西夏), 토번(吐蕃) 등은 고유 문자를 사용했는데 최만리는 이를 두고 문화 민족인 우리는 이들과 같을 수 없다고 했다. 한글 반대파 입장에서는 한자를 쓰지 않으니 모두 오랑캐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오랑캐 문자(언어)를 만들어 쓰려 하느냐는 게 이들의 논리다. 그러면서 여자, 어린 아이가 보는 게 언문(言文)이라고 폄하했다. 반면 한문은 성현의 권위 있는 문자(언어)로 인식했다. 중세 유럽의 공동 언어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듯이 한문은 공통어이고 신성한 문자라고 생각했다. 한문이 언어의 뿌리이고 독점적인 언어라고 인식했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했지만 공문서에 한글은 쓰지 않고 오로지 한자만 사용했다. 한글을 외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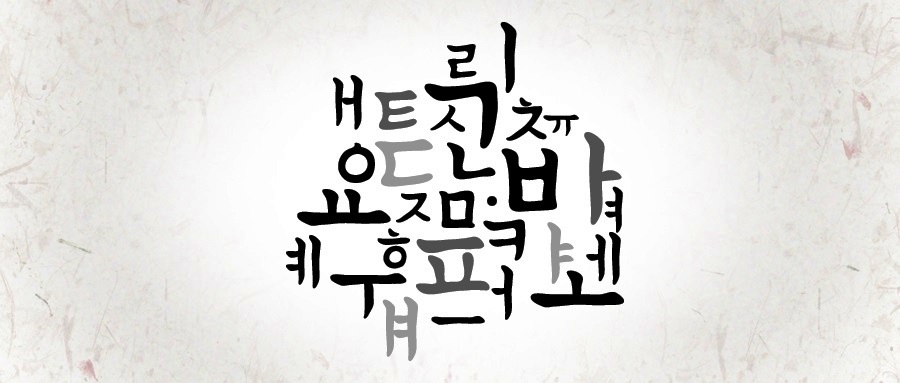
“‘3D’를 ‘삼디’로 읽는 것은, ‘3’이 뜻글자임을 생각할 때, 낯설지만 틀린 게 아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은 ‘쓰리 디’로 읽어야 한다는 통념이다. 그렇게 읽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는 하다. ‘삼디’든 ‘쓰리 디’든 다 된다는 대답은 일관성 없는 관행을 무턱대고 허용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선명하게 표현되었던 모화 의식이 영어로 옮겨가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말글 의식은 ‘3D 프린터’를 ‘삼차원 인쇄기’로 뒤쳐서 쓸 수 있을 만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言語와 社會
‘3D’를 ‘삼디’로 읽을까, ‘쓰리 디’로 읽을까?
김영환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kyh@pknu.ac.kr
“‘3D’를 ‘삼디’로 읽는 것은, ‘3’이 뜻글자임을 생각할 때, 낯설지만 틀린 게 아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은 ‘쓰리 디’로 읽어야 한다는 통념이다. 그렇게 읽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는 하다. ‘삼디’든 ‘쓰리 디’든 다 된다는 대답은 일관성 없는 관행을 무턱대고 허용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선명하게 표현되었던 모화 의식이 영어로 옮겨가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말글 의식은 ‘3D 프린터’를 ‘삼차원 인쇄기’로 뒤쳐서 쓸 수 있을 만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에 나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말 버리기’를 자랑처럼 여기는 것도 터무니없다. 대통령이 영어에 능통하면 외교도 잘 하리라 여기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통역자나 대사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한 대통령 후보가 “3D 프린터”를 ‘삼디 프린터’로 읽었다고 다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잠깐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대통령 되기에 너무도 심각한 결함’이라고 했다. 두 읽기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가. 이 문제에 제대로 답하려면 아라비아(인도) 숫자의 기호적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말에서 아라비아 숫자 읽기는 관습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3시 3분’을 ‘세시 삼분’으로 읽는다. 여기서 같은 하나의 기호 ‘3’이 토박이말 셈씨 체계로도 읽히고 한자말 셈씨 체계로 다르게 읽힘을 알 수 있다.
기호로서의 숫자는 소리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전해주지 않는다. 이 점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그 자체로는 소리에 대한 고정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한자를 닮았다. 한자는 뜻글자여서 국적을 넘어 소리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옮겨놓지 않는다. 일본식 한자 훈독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는 뜻글자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추상적 맥락에서 보면 ‘3’은 ‘셋 또는 삼’(한국어), ‘쓰리’(영어), ‘미츠’(일본어) 어느 쪽으로든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이 한국어라는 자연어에서 월(문장)의 한 부분으로 월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우리말에서 ‘쓰리’ 또는 ‘미츠’로 읽는 방식은 빼야 할 것이다. 한 언어에서 셈씨 체계가 셋이나 있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3G 이동통신, A4 용지’처럼 이미 우리말에 영어식 셈씨 체계에 따른 읽기 방식이 많이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4B 연필, 3D 업종’처럼 이미 있던 우리말 셈씨 읽기에 잘 어울리는 읽기 방식도 있다.
‘3D 프린터’를 ‘삼디 프린터’로 읽는 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로 이미 우리 사회는 영어의 위세가 강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쓰리 디’로 읽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다. ‘M1, G2, S7’을 각각 ‘엠 원, 지 투, 에스 세븐’으로 읽는 현상에서도 이런 경향을 볼 수 있다. ‘3’을 ‘쓰리’로 읽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인의 언어 의식을 전제한다. 그런 식으로 읽는다면 ‘F35’(전투기)는 ‘에프 서티파이브’로 읽어야 할 것이다. ‘엠 하나/일, 지 둘/이, 에스 일곱/칠’로 읽는 것이 옳다.
뜻글자인 아라비아 숫자를 좀 더 일관성 읽게 읽으려면 우리말에 자리 잡기 시작한 영어식 셈씨 체계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주장이 과격하고 낯설게 들리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미국말의 무게에 억눌려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일깨워 준다. 문제의 뿌리는 영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이다. ‘오 세대’라고 하면 될 것을 ‘5G’로 하니까, ‘오지’냐 ‘파이브 지’냐 시비가 생기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통령 후보가 영어를 잘 하네, 잘 못하네 말이 많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은 얼마 전에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외국 수뇌와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고 공공연히 말했다.
외국에 나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말 버리기’를 자랑처럼 여기는 것도 터무니없다. 대통령이 영어에 능통하면 외교도 잘 하리라 여기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통역자나 대사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무지와 냉대가 우리 지식인의 오랜 ‘전통’이다. 오랜 한문 숭상에서 오는 폐해를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1907년 5월 23일 치 국문판 『대한매일신보』 창간호는 한국이 자주독립의 기상을 갖지 못하고 비참한 형편에 빠진 원인을 편리한 국문은 버리고 편리하지 못한 한문을 숭상하는 폐해에서 찾았다.
이것을 그 시대의 다급한 상황에서 나온 성급한 주장으로만 여길 게 아니다. 개항 이후 우리의 글쓰기 체계는 한문으로 쓰기에서 한글로만 쓰기로 완벽하게 전환했다. 이런 큰 전환이 가능했던 까닭은 한자 및 한문이 겨레의 삶과 사상을 제대로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오랜 억압의 사상사적 뿌리는 우리가 스스로 깊이 내면화한 작은 중화 의식이다. 제도적으로는 과거제가 뒷받침했다. 이런 오랜 ‘전통’에 대한 반성이 없는 한 우리말을 아끼자는 주장은 낯설고 지나친 주장으로 여겨질 것이다.
‘3D’를 ‘삼디’로 읽는 것은, ‘3’이 뜻글자임을 생각할 때, 낯설지만 틀린 게 아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은 ‘쓰리 디’로 읽어야 한다는 통념이다. 그렇게 읽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는 하다. 영어가 뭔가 멋지고 신선해 보인다고 여기지만 우리말 셈씨 체계를 셋으로 만들어 더욱 어지럽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삼디’든 ‘쓰리 디’든 다 된다는 대답은 일관성 없는 관행을 무턱대고 허용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선명하게 표현했던 모화(慕華) 의식이 영어로 옮겨가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말글 의식은 ‘3D 프린터’를 ‘삼차원 인쇄기’로 뒤쳐서 쓸 수 있을 만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영환
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 언론사, 언어철학을 담당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글철학』(한국학술정보. 2012)이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교수신문 등 신문과 잡지에 틈틈이 글을 쓰고 있다. 겨레 역사가 실패와 좌절을 겪는 뿌리를 한글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한문 숭상에서 찾으려 애쓰고 있다. 경성제대에서 서울대로 이어진 ‘과학적’ 국어학이 제국주의 유산이라 보고 비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이 칼럼은 한글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글새소식』 제537호(2017년 5월호)에 있는 글이며, 한글학회와 필자인 김영환 교수의 동의를 얻어 『사람과사회』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Leave a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