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바라보고 있는 詩
"좋은 기억들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꽃이 핀다. 아스팔트의 갈라진 틈 사이로 힘겹게 뚫고 나오는 어린 새싹처럼 말이다."

“나이가 들면서 욕망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인지, 권력과 돈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다. 성찰이 아닌 나이 듦으로 해서 욕망이 줄어드는 현상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아름답고 뜨거웠던 날들과 비교하여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청년을 떠나는 뱀의 허물이라면 우울한 일상에 조그만 위로라도 되지 싶다. 글로 작은 돈을 버는 요즘, 詩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기억을 글로 끄집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글보다 말은 가볍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생각해보면 기억의 산에는 기억하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다. 마치 쓰레기 산처럼 냄새도 나고 무게도 크기 때문이다.
좋은 기억들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꽃이 핀다. 아스팔트의 갈라진 틈 사이로 힘겹게 뚫고 나오는 어린 새싹처럼 말이다.
오십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끔씩 순결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자동차에 부딪히는 충격같은 만남들도 인생에 한 두 번은 만나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다. 결국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오십의 나이에, 나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왜 그런 터무니없는 욕망을 품었던 것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들이 내게 성큼 다가오거나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들이 너무 눈부시고 아름다웠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가진 마력이나 매력이 나를 끌어당기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하였던 것은 틀림없다.
나이가 들면서 욕망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인지, 권력과 돈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다. 성찰이 아닌 나이 듦으로 해서 욕망이 줄어드는 현상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아름답고 뜨거웠던 날들과 비교하여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청년을 떠나는 뱀의 허물이라면 우울한 일상에 조그만 위로라도 되지 싶다.
글로 작은 돈을 버는 요즘, 詩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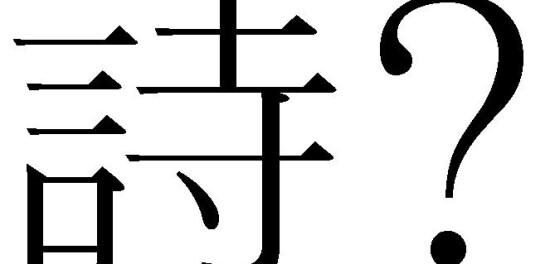





Leave a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